조요토미 희대요시? 국회의 ‘대법원장 조리돌림’

-
- 첨부파일 : image.jpg (69.1K) - 다운로드
-
105회 연결
본문

그날 국감은 ‘인민재판’ 현장
품격 잃은 비판은 폭력일 뿐
견제를 하되 모욕하지 않고,
권한을 행사하되 절제하는 것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교양
오늘 ‘조리돌림’은 내일 사법권
침해, 모레 국민 권리 침해로
우리도 ‘조리돌림’ 대상 될 것
10월 13일자 조선일보 1면, 대문짝 만한 제목이 이렇게 뽑혔다.
“국회의 ‘사법수장 조리돌림’”.
그 네 글자 ‘조리돌림’이 눈을 찔렀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러 표현이 가능할 수 있는가.
제아무리 정치의 언어가 거칠어졌다고 해도, 한 나라의 대법원장, 즉 사법부의 최고 수장을 향해 ‘조리돌림’이라는 단어가 공공의 지면에 오르내리는 현실이 이토록 모멸적이고 비극적으로 다가온 적은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단어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품격이 어디까지 추락했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다.
우리가 지금 목도한 것은 한 개인의 모욕이 아니라, 헌정 질서의 모욕이며, 법치의 존엄에 대한 집단적 무례였다.
Ⅰ.
견제의 이름으로 자행된 모욕
국회의 국정감사는 헌법이 보장한 감시 기능이다.
그러나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은 그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했다.
애초 조 대법원장은 ‘기관장’ 자격으로 출석했다.
그런데 국회 법사위원장은 갑자기 신분을 ‘증인’으로 변경했다.
절차의 일관성을 깨뜨리고, 법적 보호 없는 심문 구조로 끌고 간 것이다.
조 대법원장이 퇴장을 요청했음에도 “앉으라”는 호통과 함께 90분 가까이 자리를 떠나지 못하게 한 것은 사실상 감금에 가까운 국회 폭거였다.
그날의 장면은 국정감사가 아니라 조리돌림 의식(儀式)에 가까웠다.
질문은 진실을 향하지 않았고, 언어는 예의를 잃었다.
법을 세워야 할 국회가, 법의 수장을 옭아매는 모습은 민주주의의 품격을 스스로 짓밟은 자화상이었다.
Ⅱ.
헌법이 금한 일, 대법원장이 직접 경고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국감 인사말에서 분명히 밝혔다.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또한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 합의의 비공개를 명시한 법원조직법 제65조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
그는 이어 이렇게 말했다.
“삼권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국가에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넘어, 헌법의 경고였다.
입법부가 사법부를 심문하는 순간, 국가는 헌법 위에 정치가 서는 위험한 길로 접어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것은 명백히 헌법 제103조의 ‘사법권 독립’ 원칙을 침해한 절차였다.
Ⅲ.
‘조리돌림’이라는 말 자체의 수치
‘조리돌림’이란 단어는 본래 죄인을 공개 모욕하기 위해 거리로 끌고 다니던 형벌의 언어였다.
사람의 존엄을 짓밟고, 수치심으로 굴복시키는 폭력의 상징이었다.
그런 단어가 21세기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헌법기관 수장을 향해 어울릴 만큼 사용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이 나라 정치의 윤리적 파탄을 드러낸다.
어쩌다 우리는 국민의 대표기관을 수치의 상징어로 불러야 하는 시대에 이르렀는가.
그 단어 하나가 오늘의 국회를 고발하고 있다.
이것은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국가 붕괴의 신호탄이다.
Ⅳ.
정치가 사법을 심문할 때, 정의는 사라진다
사법부는 국가의 독립기관이며, 삼권분립의 원천이자 사법의 독립은 헌법의 기둥이다.
재판의 내용은 비판할 수 있지만, 법관의 양심과 판단은 정치의 간섭을 넘어선 영역이다.
국회가 재판 내용과 판단 방향을 묻는 순간, 그것은 민주주의의 견제가 아니라 사법권 침해가 된다.
입법부가 법을 만들 권리는 있지만, 법을 대신 해석하거나 지시할 권리는 없다.
민주주의가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은, ‘정의’를 말하는 자들이 절차를 무시할 때다.
국민의 대표라는 이름으로 헌법의 경계를 넘을 때, 그 사회는 법치가 아니라 정치의 법에 지배당한다.
Ⅴ.
국감이 인민재판이 되어버린 날
그날 국감장은 공론장이 아니라 군중의 광장이었다.
마이크를 쥔 국회의원은 질문자가 아니라 재판관처럼 행동했고, 사법수장은 대답조차 변명처럼 들려야 하는 피고로 전락했다.
여당은 조롱했고, 야당은 침묵했다.
누가 보아도, 국가의 품격을 생각한다면 “이건 지나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회의 품격 상실”이라는 언론의 지적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그 장면은 헌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입법부가 사법부를 무릎 꿇린 날, 국민의 법 감정은 함께 무너졌다.
Ⅵ.
삼권분립이 무너질 때, 국민의 권리는 무력해진다
삼권분립은 권력의 균형을 위한 장치다.
그러나 지금의 국회는 견제의 균형이 아니라 정치의 전장이 되어 있다.
정치가 법을 흔들고, 여론이 판결을 재단하며, 언론이 위장된 선악의 잣대를 들이댄다.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역설이다.
자유를 위해 만든 제도가, 자유를 억누르는 도구가 되어버린 것이다.
사법부가 정치의 표적이 되는 순간,
법의 마지막 방파제는 무너진다.
그리고 그 피해는 정치인이 아닌 국민의 권리에게 돌아온다.
Ⅶ.
우리가 잃어버린 것: 절제의 미덕, 품격의 정치
국가의 품격은 말의 품격에서 드러난다.
그것은 특히 국회의 국정감사장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권력의 언어가 거칠어질수록, 사회의 도덕은 메말라 간다.
이번 사태에서 국민이 느낀 것은 분노보다 깊은 슬픔이었다.
한 나라의 사법수장을 향해 던져진 조롱과 언성 속에서, 누구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고 말하지 않았다.
우리는 비판을 잃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품격을 잃은 비판은 폭력이다.
견제를 하되 모욕하지 않고, 권한을 행사하되 절제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교양이다.
Ⅶ.
우리가 잃어버린 것: 품격이 무너지면, 법도 무너진다
국가의 품격은 말의 품격에서 드러난다.
그것은 특히 국회의 국정감사장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권력의 언어가 거칠어질수록, 사회의 도덕은 메말라 간다.
이번 사태에서 국민이 느낀 것은 분노보다 깊은 슬픔이었다.
우리는 비판을 잃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품격을 잃은 비판은 폭력이다.
견제를 하되 모욕하지 않고, 권한을 행사하되 절제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교양이다.
그리고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품격이 무너지면, 법도 무너진다.
조희대 대법원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의 ‘조리돌림’은 내일의 사법권 침해로, 그리고 모레의 국민 권리 침해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가 침묵한다면, 언젠가 “그때 왜 말하지 않았는가”라는 물음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때는 우리 역시, ‘조리돌림’의 대상이 되지 않으리란 보장조차 없을 것이다.
최원호 박사(Ph.D)
심리학자·칼럼니스트
심리학 박사로 서울 한영신대와 고려대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했습니다.
<열등감을 도구로 쓰신 예수>, <열등감, 예수를 만나다>, <나는 열등한 나를 사랑한다> 등 베스트셀러 저자로 서울 중랑구 은혜제일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최원호 박사의 이중창’ 칼럼은 신앙과 심리학의 결합된 통찰력을 통해 사회, 심리, 그리고 신앙의 복잡한 문제의 해결을 추구합니다.
새로운 통찰력과 지혜로 독자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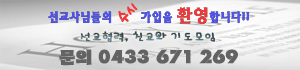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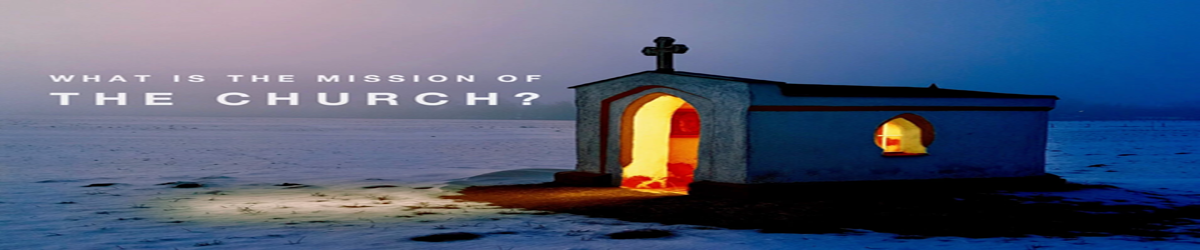

































댓글목록0